지역경제 파급효과 개략 계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지역산업 연관모형(RIO; Regional Input Output Model)을 이용하여 도로 건설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합니다.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는 건설업을 세분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도로시설을 세분화해서 별도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2010년 한국은행의 실측 산업연관표는 작성에 약 2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세부부문별 중간투입 구조를 이용하여 각 지역 및 산업에 투자지출을 배분,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나옵니다. 자세한 분석 방법이나 수치는 찾기 어렵습니다.
개략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1) 지역산업연관표
지역산업연관표에는 16개 시군별 생산유발 계수, 부가가치 계수, 수입유발 계수, 취업유발 계수가 실려있습니다. 보고서에 수록되어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보고서는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15'입니다. 이후에도 지역산업연관표를 발표했으나 지역간 계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5편 16개 시도별 경제구조와 산업연관 효과'에서 각 지역의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계수를 복사합니다. 최신 자료인 2013년의 자료를 이용합니다.
위의 표에서 2013년(B) 항목을 보면 서울시에서 최종수요 한 단위를 생산했을 때 각 지역에 미치는 생산 유발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1억원 어치의 최종수요를 생산하면, 서울은 1.036억원, 대구는 0.01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합니다. 전지역 합계는 1.806인데 표에는 1.808로 적혀 있습니다. 다른 지역 표도 합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계는 따로 계산했습니다.
2) 건설부문 유발계수
앞절의 유발계수는 모든 품목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도로부문의 유발계수를 고려하여 조정해야합니다. 그러나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품목에서 도로부문은 건설 항목에 통합되어 있어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오차를 감수하고 건설부문의 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보정합니다. 품목별 생산유발계수가 나온 최신 자료는 '2015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19'입니다. 건설부문의 품목별 생산유발계수는 1.997입니다. 각 지역의 생산유발계수를 1.997로 보정합니다. 예를 들어, 충북의 생산유발계수 합은 1.879이며, 지역별 각 계수에 1.997/1.879를 곱해 생산유발계수를 보정합니다.
2015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19, 206쪽 표 V-22
3) 예비타당성 보고서 결과와 비교
개략 계산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근의 예비타당성 보고서와 비교해 봤습니다. 지역별 비율은 다르나 총합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기존 예비타당성 보고서의 결과 대비 3% 이내로 과소 추정되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은 아니지만 필요시 간단하게 생산유발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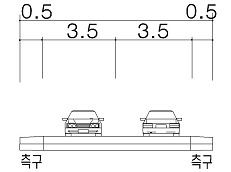
댓글
댓글 쓰기